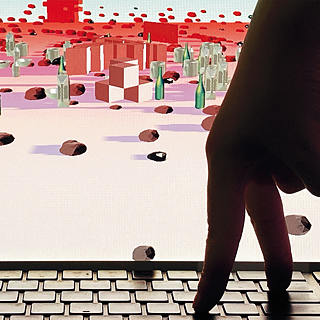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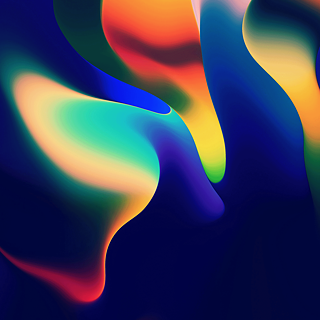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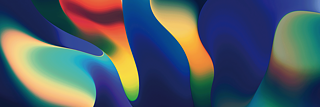
문화 지원사업
주한독일문화원은 예술가와 문화예술 관계자들 간의 국제적인 교류를 장려하고, 문화와 교육 및 학문 분야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모와 레지던시 및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전자도서관(Onleihe)
전자도서관(Onleihe)은 괴테 인스티투트 도서관이 제공하는 무료 디지털 서비스입니다. 현재 2만 3천 개의 독일어 전자책, 오디오책, 독일어 학습 자료, 정기 간행물 그리고 신문들을 다운로드해 볼 수 있으며 온라인 영화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필름 아카이브
국내 비영리 상영을 위해 기관 및 문화 단체에 650편 이상의 독일 영화 DVD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독일문화원의 아카이브
주한독일문화원의 아카이브는 1968년부터 주한독일문화원의 다각적인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예약을 통해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