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학 칼럼 ‘언어를 말하다’
부풀려진 표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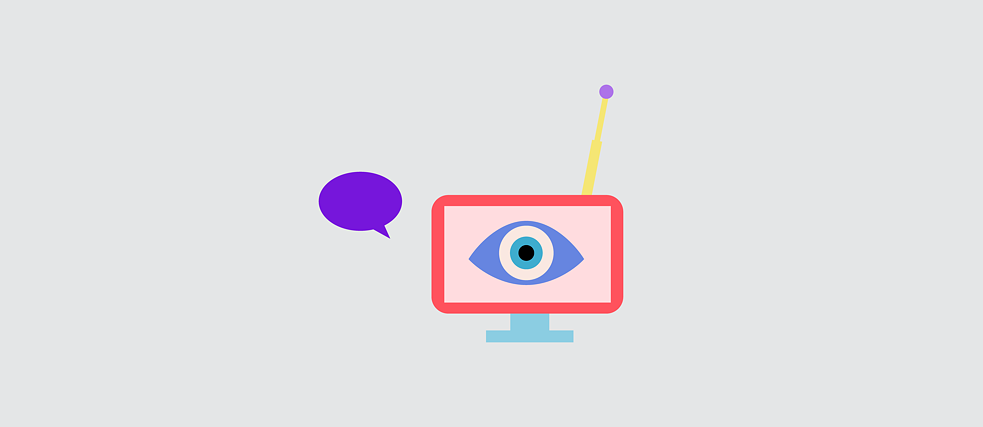
언어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 © 괴테 인스티투트/일러스트: Tobias Schrank
언어학 칼럼 시리즈의 마지막 편에서 올가 그랴스노바는 독일어에서 특별한 위치를 가지는 두 가지 표현을 주제로 삼았다. 그중 ‘고향(Heimat)’이라는 표현은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반면, ‘뿌리(Wurzeln)’라는 표현은 그래서 매우 직관적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이 두 표현 모두 중립적인 언어는 아니다.
독일어에서 거의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부풀려져 사용되는 두 단어가 있다. 바로 ‘고향(Heimat)’과 ‘뿌리(Wurzeln)’이다. 독일에서는 2018년에 심지어 한 부처명에 고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까지 했다.
고향이란 무엇인가?
고향이란 매우 모호한 것이다. 이 표현은 그 개념을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왜냐하면 지리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그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히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향이란 자기가 살던 마을, 익숙한 지역, 한 나라 혹은 아예 대륙 전체 중에서 무엇을 의미할까? 심지어 정신적인 고향과 정치적인 고향이라는 의미가 일반적인 언어 사용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면 고향의 끝은 어디이고 시작은 어디일까? 고향이라는 느낌을 주는 범위는 몇 킬로미터까지일까? 결국 고향이라는 말에는 지리적 요소뿐 아니라 시간적인 요소도 포함되며, 대체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기억을 말한다. 우리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 특정한 냄새, 자신의 어린 시절을 기억한다. 고향이란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위치보다는 감정에 가까우며, 항상 현재보다는 과거에 조금 더 관련되어 있다.고향은 이성적인 언어인 독일어가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는 몇 안 되는 표현 중 하나다. 그리고 고향이라는 표현에는 어딘가 비합리적인 면도 내포되어 있다. 자기 고향을 떠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이 꼭 어쩔 수 없어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서로 간의 거리가 가까운 마을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거나, 도시의 번잡함을 뒤로하고 시골에 정착하고, 여행을 떠나거나 이사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 누구도 전설 속의 고향을 그리워하거나 혹은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고향이라는 표현은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남용되기 쉽다.
방어선
문제가 되는 것은, 고향이라는 표현이 정치적 맥락에서 나타날 때다. 고향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폭넓고 불분명하게 정의되지만, 외부침입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갑자기 ‘애국적인’ 형태를 갖게 된다. 자기 고향을 지키는 것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이들 사이에서 가장 작으면서도 유일한 공통분모일 때가 종종 있으며, 이때 고향을 지킨다는 것은 환경보호와 같은 보호가 아니라 국경을 방어한다는 함의를 가진다. 고향은 종종 주류 문화와 소수자를 구분하곤 한다. 그리고 자기 고향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권리, 시민권 획득, 소수자 보호, 시민 자유, 기본법 등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고향은 타고나는 것, 즉 태어나면서부터 얻는 것이며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고향은 나뉘어져서는 안되며, 모든 것이 예전과 같은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한다.뿌리 대신 다리
뿌리에 대한 은유는 그다지 이상하지는 않다. 이런 은유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이미 고대 작가들부터 사용하던 표현이다. 그렇지만 나는 이제 성장을 끝낸 인간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식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흥미롭게도 ‘뿌리’라는 표현에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쓰는 것은 주로 유대계 작가들이다. 요제프 로트(Joseph Roth)는 ‘인간은 나무가 아니다(Der Mensch ist kein Baum)’라고 분명하게 언급하였으며, 아이작 도이처(Isaac Deutscher)는 ‘나무에는 뿌리가, 유대인에게는 다리가 있다(Bäume haben Wurzeln, Juden haben Beine)’라고 확언한 바 있다. 나에게는 당연히 이 두 작가의 표현이 인간을 식물에 빗대는 모든 은유적 수사보다 더 명료하게 이해되는데,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실제로 뿌리가 아닌 다리가 있고 특별한 제약이 없는 한 그 다리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광합성을 할 수 없고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없지만,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 태어났다고는 말할 수는 있다. 인간은 가는 길에 장애물이 없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장소를 옮겨 이동할 수 있다. 반면 식물은 장소를 이동하려면 일단 뽑아서 다른 화분으로 옮겨 심는 수밖에 없다. 사람은 변화할 수 있고, 돌아다닐 수 있고, 여행을 하고, 배우고, 돌아오고, 다시 여행을 떠날 수 있다. 뿌리에 대한 은유는 토지, 특정 토지에 자연스레 연결되어 있다는 것, 즉 특정 집단을 비롯해 최근에는 또한 문화적 전통에 지리적, 민족적으로 소속되어 있음을 암시하는데, 이런 전통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도 전통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질 들뢰즈(Gilles Deleuze)와 정신과 의사 펠릭스 가타리(Felix Guattari)는 이런 점을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리좀(Rhizom)이라는 표현을 만들었다.고향에 대한 은유와 반대로 뿌리에 대한 은유는 매우 직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 뿌리와 어머니 대지는 멀지 않고, 어머니 대지라는 표현에는 좋지 않은 징조가 있다. 이는 특히 독일에서 그렇다. 피와 땅의 이데올로기(Blut und Boden Ideologie)가 국가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핵심 요소였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언어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으며, 은유적 표현은 더욱 그렇다.
언어를 말하다 - 언어학칼럼
본 칼럼 ‘언어를 말하다’는 2주마다 언어를 주제로 다룬다. 언어의 발전사, 언어에 대한 작가의 생각과 언어의 사회적 영향력 등 문화적, 사회적 현상인 언어를 주제로 한다. 언어 전문가나 다른 분야의 칼럼니스트들이 돌아가면서 자신의 관심 주제에 대해 6개의 기고문을 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