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학 칼럼 '언어를 말하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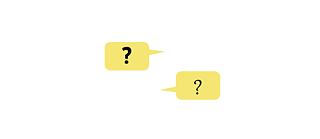
독일어권에는 사투리가 풍부하다. 하스나인 카짐은 이 사투리들이 만들어내는 차이와 다양성을 아주 좋아한다. 비록 그가 북독일 출신으로 남부 지방에서 온 사람이 그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항상 한 번에 알아차리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내가 살던 지역에서 우리는 저지 독일어를 쓴다(Dor, wo ik her kümm, snackt wi Platt). 글쎄, 사실 우리(wi)라기보다는 농부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사용하기는 한다. 어쨌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더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내가 아는 한 중년인 내 나이대에서는 일상에서 저지 독일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며, 나보다 어린 사람들은 일단 확실히 쓰지 않는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저지 독일어는 북부 독일 전역에 널리 퍼져 있는데, 마을마다 그 진정한 본질적 의미에서 중대한 차이가 있기는 하다. 어떤 마을에서는 소(Kuh)를 ‘코이(Koi)’라고 하는 반면 다른 마을에서는 ‘카우(Kau)’라고 한다. 그리고 물론 다른 마을 출신의 ‘천치(Dösbaddel)’, 즉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de nix weet un nix köönt)’ 이를 깔본다.
이해하기 어려움
내가 학업을 마친 후 하일브론(Heilbronn)의 지역 일간지 하일브로너 슈팀메(Heilbronner Stimme)에서 일하기 위해 그곳으로 이주했을 때, 그곳 사람들은 내게는 꽤 낯선 언어인 슈바벤 사투리를 썼다.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학자, 노동자,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그랬다. 놀라웠다. 사람들은 자신의 사투리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투리를 하는 것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표준어만 빼고’라는 태도였으며, 이는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슬로건이기도 하다. 그들은 ‘슈바벤 사투리(Schwäbisch)로 말하는 것은 이토록 멋지고, 훌륭한 일이다!(s'isch scho schee, s'isch dr Wahnsinn, wenn mir Schwäbisch schwätzet!)’라며, 정말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북독일에서 ‘우리는 표준어 빼고 뭐든지 할 수 있다!(Wi könnt allens blots keen Hoogdüütsch!)’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결코 있을 수 없는(Dat geiht gaar nich!)’ 일이다. 그러면 왜 있을 수 없는 걸까? 북독일에서는 저지 독일어를 쓰는 것을 조금은 부끄러워하는 반면, 슈바벤 사람들(Schwaben)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방언을 가꾸어 나가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예전에 슈바벤 사투리가 강한 편집실 동료 한 명이 있었는데, 어떤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모든 문장에 대해 두세 번은 ‘뭐라고?’라며 되물어야 했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너무 불편해 ‘아하!’, ‘하하!’, ‘글쎄요’, ‘그렇죠’라며 그냥 이해한 척을 했다. 대부분은 괜찮았다. 가끔은 확실히 틀릴 때도 있었는데, 그가 나를 측은해 하거나 당황한 얼굴로 바라보았던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당시 이미 이메일과 메신저가 있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서면으로 확실히 해 두었다.
미묘한 차이에 대한 찬사
이런 이유로 자국에서 자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나는 내가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작센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경우 그들을 칭찬한다. “독일어 잘 하시네요!”라고. 물론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이고, 그들이 나의 독일어를 칭찬할 때만 그렇게 한다. 나는 사투리와 방언이 좋다. 상대방이 어떤 지역, 또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지가 들릴 때가 좋다. 언어는 항상 지리적, 사회적 출신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 이는 마치 옷차림과 같아, 만약 우리가 모두 같은 유니폼을 입었다면 분명 재미가 없었을 것이다.예를 들어 내 아들은 빈의 색채가 가미된 표준 독일어를 구사한다. 내 아들은 북독일에 살아본 적이 없다. 이는 분명 부모인 우리에게 배운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는 수년간에 걸쳐 오스트리아 단어와 표현들을 자신의 어휘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독일에서 사용하는 ‘모자(Mütze)’ 대신 ‘쓰개(Haube)’라고, ‘소년(Junge)’ 대신에 ‘젊은이(Bursche)’라고, ‘봉투(Tüte)’ 대신 ‘봉지(Sackerl)’라고 한다. 또 ‘쓰레기(Müll)’는 ‘오물(Mist)’이라고 한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 독일에서처럼 ‘대단하다(geil)’, ‘멋지다(cool)’, ‘끝내준다(krass)’가 아닌 ‘정말 대단하다(urgeil)‘, ‘정말 멋지다(urcool)’, ‘정말 끝내준다(urkrass)’라고 말한다. 최근에는 심지어 한 청소년이 무언가에 대해 ‘정말 민망하다(urcringe)’라는 식으로 신조어를 말하는 것을 들었다. ‘정말 멋진(urschön)’ 일이다.
사투리의 경계
예전에 나는 모든 것의 기준을 뷔르츠부르크(Würzburg), 아니, 하노버(Hannover)부터 남쪽은 전부 바이에른 사투리(Bayerisch)를 쓴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결코 틀린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독일 어학에서는 독일 남동부 지역과 오스트리아의 사투리가 바이에른 사투리로 함께 묶이기 때문이다. 또 주목할 만한 것인 헤센 사투리(Hessisch)는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그 당시 내가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빈 사투리(Weanarisch)와 오스트리아 북부 사투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프랑켄 지역과 바이에른 숲에서 말하는 방식은 어떻게 다를까? 차이점이 하나라도 있기는 할까? 나도 안다, 내가 문외한이었다는 것을.하지만 방언에 대해 배운 지금은 포어아를베르크(Vorarlberg) 사람과 케른텐(Kärnten) 사람을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구분할 수 있고, 티롤 지역의 목이 쉰 듯한 소리와 슈타이어마르크의 소리치듯 말하는 소리를 아주 잘 구분할 수도 있다. 그라츠(Graz)에서 사용하는 말은 가까운 레오벤(Leoben) 지역과 또 다르다. 그리고 나는 빈 사투리가 좋다. 아니, 사랑한다. 내가 아는 그 어떤 언어도 빈 사투리처럼 매력적이면서도 고약한 것이 없다. 또는, 이렇게 고약하게 매력적인 언어도 없다. 빈 사투리를 들으면 항상 상대방이 자신을 칭찬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아니 잠깐, 지금 나를 모욕한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맛있다’ 대신 ‘맛 좋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사투리가 사라지는 것을 걱정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오스트리아에서도 많이 보는 독일 텔레비전 방송에 책임을 묻는다.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오스트리아식 독일어에 비해 독일식 독일어가 지배적이다. 부모는 자녀에게 “오스트리아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해!”라고 말하곤 한다. 독일에서는 무언가를 ‘재촉(drängen)’하지만 오스트리아에서는 ‘독촉(urgieren)’한다. 이메일에 ‘회신(zurückschicken)’하거나 ‘답변(antworten)’하는 대신 ‘반환(retournieren)’한다. 의회에서도 ‘원내정당(Fraktion)’이 아닌 ‘클럽(Klub)’이 있으며, 장관들도 취임 시에 ‘선서(vereidigen)’가 아니라 ‘맹세(anloben)’ 한다. 서류에는 ‘서명(unterschreiben)’하는 것이 아니라 ‘서기(unterfertigen)’한다. 그리고 훌륭한 오스트리아 요리 중에서는 ‘맛이 좋고(köstlich)’, ‘훌륭하고(hervorragend)’, ‘풍미가 아주 좋은(mundet sehr)’ 것들이 많지만, ‘맛있는(lecker)’ 것은 아무것도, 정말로 아무것도 없다! ‘맛있다’니, 어휴, 그야말로 독일식 독일어다.나는 이 모든 것이 좋다. 이런 차이들이 좋다. 나는 다양성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나는 미묘한 차이들에 감탄하고, 변덕을 즐긴다. 나는 언어와 사투리는 가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알레만어, 바이에른어, 동프랑켄어, 라인프랑켄어, 서프리슬란트어, 저지 독일어 등은 소멸할 위험이 있는 언어에 속한다. 우리는 이 언어들을 구해야 한다! 그러기를 독촉(urgieren)해야 한다! 나는 그래서 지금부터 저지 독일어만 쓰려고 한다! 하지만 그러면 빈에 사는 누구도 내 말을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할 테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Dorüm schall ik af sofort bloot noch Plattdüütsch snacken! Blots versteiht mi denn in Wien nüms mehr. Schaad!)
언어를 말하다 - 언어학칼럼
본 칼럼 ‘언어를 말하다’는 2주마다 언어를 주제로 다룬다. 언어의 발전사, 언어에 대한 작가의 생각과 언어의 사회적 영향력 등 문화적, 사회적 현상인 언어를 주제로 한다. 언어 전문가나 다른 분야의 칼럼니스트들이 돌아가면서 자신의 관심 주제에 대해 6개의 기고문을 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