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학 칼럼 ‘언어를 말하다’
새로운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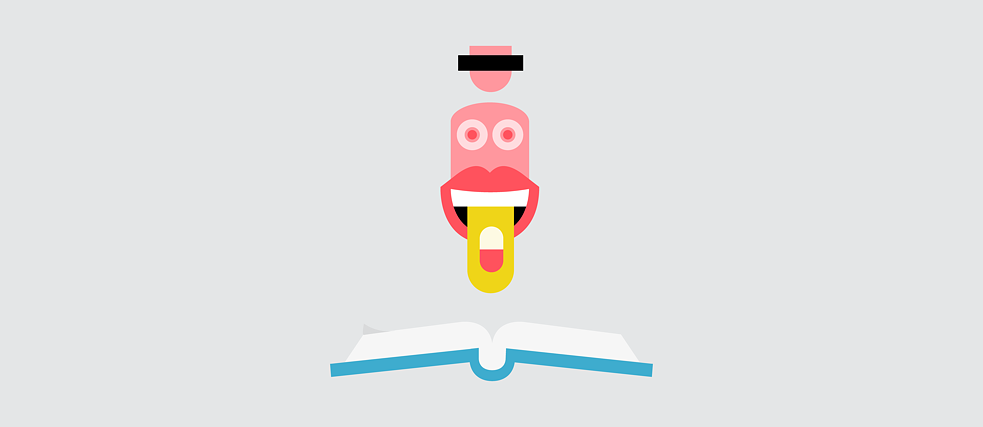
현대문학과 접근성, 어울리는 말일까? 하우케 휘크슈태트와 그가 이끄는 문학의 집 팀은 반드시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들은 미지의 영역에 발을 들일 마음이 있는 작가들을 찾았다.
친애하는 인간 혐오자 여러분, 친애하는 소인배 여러분, 존경하는 업계 관계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독일의 약 1,500만 명이 글을 읽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중에는 아예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당신들의 출판사, 유통 센터, 서점, 김나지움, 재단 이사회나 정치적 권한의 틀 안에서 글을 읽지 못하는 이들 1,500만 명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해도, 적어도 이들 역시 수백만 명의 구매자이다. ‘물론, 이런 사람들을 위해 아동용 서적이 있지! 그런데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지?’라고 물을 수도 있겠다. 아스트리드 린드그렌(Astrid Lindgren)은 물론 훌륭한 작가다. 그리고 그의 책 ‘괴물들이 사는 나라(Wo die wilden Kerle wohnen)’는 독일어를 배우기 위한 훌륭한 방법이다. 우리는 이 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누가 이것을 읽고 싶을까? 그 수준이 문제다. 나의 언어는 나의 보루다. 이런 것은 내 요새에 들어올 수 없다. 쉬운 언어로 쓰인 뉴스 기사는 있지만, 글쎄, 문학은? 안된다. 그건 너무 멀리 나갔다. 업계는 관용을 구현하고 담론에 기여하며 의미를 창출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데, 이들은 방어적인 반응과 제스처를 취하는 것에 정말로 능숙하다. 이것은 독자를 얻는 대신 독자를 몰아낼 뿐이다.
복잡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 칼럼에서 나는 가진 것을 지키려고만 하고 사사건건 반대하는 이들에 내가 왜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인지 설명하려 한다. 또 쉬운 언어로 쓰인 문학이 복잡하지 않을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이다. 우리가 마르셀 브로이어(Marcel Breuer)를 칭송하기는 하지만, 장황히 이어지는 긴 문장도 좋은 문체라고 여겨진다. 내 말은, 엘리베이터와 경사로가 계단을 없애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내 말은, 좋은 아이디어 하나가 나쁜 아이디어를 여럿 쓰러뜨리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나는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문학의 집이 저명한 작가들과 함께 상황을 타개할 돌파구를 찾는 방법을 설명할 것이다. 목표 집단에 대한 개념이 하나의 해충이라는 것도 설명할 것이다. 나는 자폐증이 있는 사람들, 고등학교 교사들, 문맹인 이들과의 대화를 기억한다. 또 뇌졸중에서 회복한 사람들, 독일어 학습자 몇 명, 예비 교사들로 가득했던 세미나, 통합교실에서 만난 한 학생, 하이델베르크의 교육학 연구그룹과 나누었던 대화도 기억한다. 그리고 나는 왜 내가 바우하우스, 울리포,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의 레디메이드(Ready Mades), 그리고 다국어를 하며 모든 것에 해박한 친구인 소화기와 담요에 대해 자주 생각하는지에 대해 쓸 것이다. 그 밖에도 이 모든 것이 ‘읽자! 책을. 쉬운 언어로 쓰인 문학(LiES! – Das Buch. Literatur in Einfacher Sprache)’라는 한 권의 책으로 탄생한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 책은 봉쇄 조치 중이던 2020년 3월에 출간되었다.예술 행위
4년 전에 통합 네트워크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지부(Netzwerk Inklusion Frankfurt am Main)와 프랑크푸르트 시 통합 사무국 대표들이 우리 문학의 집을 방문하여 이런 이야기를 했다. 접근성과 관련해 프랑크푸르트는 비교적 앞서 있고 진보적인 도시라는 것이었다. 그러니 그다음 단계는 이제 예술과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박물관과 극장에서 하는 프로젝트들이 있다고 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언어, 문학, 접근성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물었다. 생각해보면 읽는 즐거움 출판사(Spaß am Lesen-Verlag)처럼 고전 문학이나 대중 문학을 쉬운 언어로 제공하는 출판사들이 있다. 이는 대부분 원래 있는 작품을 쉬운 언어로 번역하거나 변환한 책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에 대해 격을 낮추고 다운그레이드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이다.이런 책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드라큘라, 모비딕, 톰 소여의 모험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은 청소년 소설인 ‘우리들의 발카라이(Tschick)’를 알게 되고 하인리히 뵐(Heinrich Böll)의 이야기를 뒤늦게나마 읽을 수 있다. 이게 전부다. 당시 우리는 이미 작가들과의 외주 작업에 대해 좋은 경험이 많았었다. 작가들에게 예술 작품에 대한 글을 써 달라고 자주 요청했던 것이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 착안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치매를 앓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쓴 아르노 가이거(Arno Geiger)의 책 ‘유배 중인 나의 왕(Der alte König in seinem Exil)’을 쉬운 언어로 된 짧은 버전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은 멋진 일이다. 그렇지만 아르노 가이거와 같은 작가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오로지 쉬운 언어로만 쓴다면 어떨까? 이런 쉬운 글이 처음부터 예술 행위라고 여겨진다면? 이에 대한 규칙과 이에 대한 의지가 있는 작가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했다.
우리가 문의한 여섯 명 모두 곧바로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작가들은 예술이 이미 완결되어 있으며, 더 이상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는다면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약 미래가 말을 한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이 운동의 정점은 우리가 어제 서 있던 그곳이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을 위한 문학? 이런 것은 지금까지 없었다. 그럴 수는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알리사 발저(Alissa Walser), 크리스토프 맥누손(Kristof Magnusson), 노라 보송(Nora Bossong), 미르코 본(Mirko Bonné), 헤닝 아렌스(Henning Ahrens), 올가 그랴스노바(Olga Grjasnowa)가 함께하기로 했다. 선구적인 업적이, 무언가가 탄생했다.
언어를 말하다 - 언어학칼럼
본 칼럼 ‘언어를 말하다’는 2주마다 언어를 주제로 다룬다. 언어의 발전사, 언어에 대한 작가의 생각과 언어의 사회적 영향력 등 문화적, 사회적 현상인 언어를 주제로 한다. 언어 전문가나 다른 분야의 칼럼니스트들이 돌아가면서 자신의 관심 주제에 대해 6개의 기고문을 연재한다.